일본, 중국, 러시아등이 스텔스 전투기들을 빠르게 전력화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를 잡을 수 있는 안티(카운터)스텔스 기술 개발에 착수 해서 내년초에 대충의 밑그림이 나올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텔스전투기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안티스텔스(Anti Stealth) 기술은 딱 한 번 증빙됐을 뿐, 최근에는 말만 무성하다. 다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인류의 무기체계는 창과 방패의 대결로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矛)과 모든 창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盾)의 경쟁이 더 나은 창과 방패를 낳는 논리적 모순이 스텔스 분야에서도 재연될지 주목됩니다.
이제 막 창(스텔스전투기)을 획득한 우리 공군도 스텔스 방패에 대한 연구에 공식적으로 발을 디뎠을뿐 입니다.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스텔스항공기 방어무기 개발 개념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F-117 나이트 호크를 1999년 3월 보스니아 전쟁 당시 유고슬라비아군은 코소보 공습에 투입된 F-117기에 1960년대에 첫선을 보인 구식 SA-3 고아미사일 2발을 발사해 격추시켰습니다.
비행경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설과 체코제 최신 레이더와 구형 미사일을 결합한 방공망이 찰나의 순간을 잡아냈다는 설이 엇갈리지만 미국은 이후 F-117을 서둘러 퇴역시키고 F-22 랩터전투기와 F-35 시리즈로 바꿨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당시 격추된 F-117의 잔해를 입수해 미국과의 스텔스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했습니다.
4월9일 아오모리 부근 바다에 추락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전투기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일본은 물론 미국도 P-8A해상초계기와 B-52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한 데는 코소보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카운터스텔스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S-400 방공 시스템으로 스텔스기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하고 중국은 2014년에도 구축함의 레이더로 350㎞나 떨어진 미국 F-35A전투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과장이 섞였다고 치부하기에는 이들 국가, 특히 중국의 노력이 집요합니다. 능동 및 수동형 레이더 개발에서 비행체의 전면이 아니라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삼각측정법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안티스텔스 레이더 기술을 축적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굴지의 방산업체 책임자급 엔지니어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안티스텔스 관련 기술의 발달로 항속거리가 짧고 최고 속력도 낮으며 무장 탑재량이 작은 스텔스전투기들이 효용가치를 상실하는 시대가 예상외로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투기 관련 기술이 단시일 내에 의지와 투자만으로 축적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국형 전투기(KF-X) 성사 여부를 불투명하게 여기지만 안티스텔스 기술로 KF-X가 일부 항전장비를 제외하고는 종합적으로 F-35A보다 나은 전투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한국이 원한다면 관련 기술을 제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안티스텔스 레이더를 개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도 안티스텔스 레이더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한 국방 사업이 되었는데요, 각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과 보안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 연구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공군은 최근 이와 관련된 기초용역 연구를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용역의 제목은 ‘장거리·저피탐항체 대응 지대공방공유도무기체계(탐지/요격 능력) 확보 방안 연구’. 스텔스기를 장거리에서 탐지해 요격하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방향을 잡자는 게 연구용역의 목표입니다. 공군은 연구 목적에 스텔스전투기뿐 아니라 순항미사일과 무인기까지 포함했습니다. 영공에 도달하기 전에 파악해 영공 침입 시 바로 격퇴한다는 발상이 깔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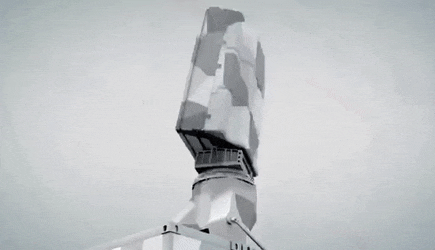
공군의 연구용역 발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었어도 의지만 있다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뿐 아니라 방패도 필요하다는 명제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스텔스기 연구와 생산·배치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비공식적으로 자체 연구해온 기반도 없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방법이 국내 기술로 제시된 적도 있습니다. 올해 말 나올 예정인 공군 발주의 연구용역 결과는 군과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향후 무기체계 소요 제기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국내 기술로 스텔스를 잡는 레이더와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 언제 가시권에 들어올지 주목됩니다.
[권홍우 선임기자의 무기이야기 내용 참고및 축약]
'밀덕 ,잡학 > 밀리터리[military]밀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 스텔스 무인기 개발 착수 (2030년 실전배치) (0) | 2019.09.02 |
|---|---|
| 한국형 항공모함 2033년경 F-35B 탑제 경항모 진수예정!! (0) | 2019.08.31 |
| 항공모함 보유국가(보유국)와 항공모함 보유예정 국가!-1편 (0) | 2019.08.26 |
| 수리온 공격헬기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러시아(불곰국) 공격헬기 Mi-24 하인드 (6) | 2019.08.22 |
| 미국 대만에 F-16V(바이퍼) 수출, 세계최고의 베스트 셀러 전투기 F-16 제원 (2) | 2019.08.21 |




댓글